입춘은 애저녁에 지났지만 공식적인 봄의 시작은 어제였던 거 같다.
휴일도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와 있었다.
나무가 많은 동네라 노랑 분홍 연두색 가루를 뿌려 놓은 거 같은 모습이고
구름이 낮은 흐린 날은 얇은 솜 이불을 덮은 듯 포근함마저 더해준다.
다양한 모습의 개들이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고 그 중 몇몇은 썩 잘 어울리는 옷까지 입고 있다.
허리를 조이는 남색 코트를 걸치고 있던 그레이 하운드에게 베스트 드레서 상을 주겠다. 옷발은 역시 말라야 산다.
하지만 벌거벗고 있는 통통한 갈색푸들도 정말 귀엽다. 굴곡이라곤 전혀 없는 평평한 등허리를 햄처럼 한 입 베어물고 싶어진다.
몇년 동안 외벽으로 감추어져 있던 거대한 건물이 준공의 위용을 뽐낸다.
흰 고래같은 건물에서 검은 얼굴의 인부들이 나와 삼삼오오 퇴근을 한다. 후련해 보이는 표정들이다.
키가 껑충 크고 무릎에 붕대를 감은 여학생은 반바지 교복을 입고 두 개 남은 탕후루를 씹어 먹으며 걸어간다.
학원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젊은 엄마들은 각자 자식들의 흉내를 내며 깔깔 웃어댄다.
며칠 전 잃어버린 샴푸브러쉬를 사러 다이소에 들어갔다. 물건들의 정보량에 압도되어 잠시 넋이 나갔다.
이 곳은 유혹의 시험장이다. 작고 깜찍한데 싸기까지 한 옥색 커피잔 세트를 거의 사 버릴 뻔 했다.
서너살 쯤 되어보이는 아주 작은 여자아이와 엄마의 대화를 엿듣는다.
엄마 엄청 예쁜 벚꽃 컵 샀어 / 잘했어, 엄마 짱!
뒤에 오는게 애가 한 말이다. 별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대단히 담백한, 상대 위주의 격려였는데
저래서 딸 좋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한다. 벚꽃 컵을 손에 들고 둘은 마중나온 아빠의 차를 향해 달려간다.
나는 이미자의 봄날은 간다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간다.
작은 방(밝음)과 큰 방(어두움)의 구조를 반대로 바꾸었다. 이제 큰 방이 침실이다.
버릴 것을 추리며 몇 가지는 당근으로 싸게 팔았다.
주차장 택배함에 팔린 물건을 넣고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기는데
왜 안 들어가? 귀가하는 윗집 분이 묻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답을 하니 웃음소리가 들린다.
다 했으니까 들어가야지. 열린 문으로 재빨리 따라 들어간다.
주민센터에서 빌려온 드릴은 비트가 안 빠진다. 어찌나 단단히 물려있는지 손바닥이 까질 지경이길래
툴맨이신 앞집 분께 들고 가니 본인의 드릴을 선뜻 내주신다. 감사의 표시로 과자를 드렸다.
청소를 마치고 시장에서 충동적으로 사온 취나물을 어설프게 무쳐봤다. 덜 삶아져 뻑뻑했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방 구조를 바꾸며 모뎀이 불통이 되었는데 덕분에 인터넷을 최소량으로 사용한 하루가 되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것 만으로도 머릿 속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길래
와이파이 부가기능 해지신청을 했다. 인터넷 유지하는 조건으로 위약금도 면제해 준다니 아주 땡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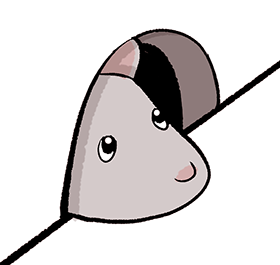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