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은날 여의도 공원 잔디밭에 엎드려 독서를 시도한 적이 있다.
하얀 종이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고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다.
주위가 어두워졌을때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는 것은 불가능했다.
왼쪽이던 오른쪽이던 사상적으로 크게 치우친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가슴 깊은 곳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현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데로 보고있구나. 라는 느낌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는 행위는 상당한 에너지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다들 아다리가 맞고 답이 나오는 걸 좋아하니까.. 당장 나부터도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사고를 관둔 듯한 면이 있고
논문을 자주쓰던 a가 한말 중 기억에 남는게 있는데,
논문을 쓸땐 should,would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must를 지양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
정확성을 기하려면 맹신적 태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일반적인 작문법과는 정반대로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듯~같아요~경향이 있습니다~ 등의 어법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확신에 찬 주장이 넘쳐나는 세상 속 어느 누가 저런 찌질이 화법에 눈길을 주겠는가
하지만 세상에 원인을 단언할 수 있는 현상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한 뒤 말하고 터는거지
또는 미치지 않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요새는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그래서 주장보다는 감상이 편하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상과 종교의 피튀기는 전쟁터를 들여다보다 예술과 과학의 세계로 눈길을 돌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정치글 싫다고 했던 블로그 방문자의 심정이 이런거였구나 싶다.
가능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중간 명도의 세계에 머무르고 싶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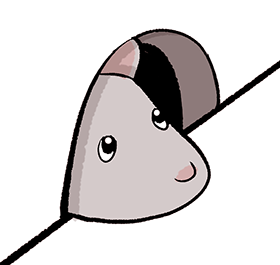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