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부터 후반까지 홍대 놀이터는 많은 이들의 아지트였다.
벤치 아래로 쥐가 질주하는 오른쪽 코너는 펑크족들 차지였고
중앙에선 아마추어 MC들이 둥글게 모여 랩을 했으며
왼쪽의 가장 넓은 공간은 홍대를 방문하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SNS나 카톡 등을 사용하지 않던 시기라 사람이 만나고 싶으면 놀이터나 가자, 하고 거기로 향하곤했다.
가면 아는 사람 한두명은 무조건 앉아 있었다.
반가운 사람일 때도 아 노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같은 장소에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항상 나와 있었다는 거다.
약속을 잡고 시간을 정해 만나는 만남과는 다르다. ' 내킬 때 ' 나가서 ' 그냥 ' 본다는 것이 이런 만남의 핵심이다.
시간을, 사람을 선택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운에 나를 맡기는, 그리고 펼쳐지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의 만남들이었다.
휴대폰이 등장하기 전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것이다.
동네 어귀의 큰 나무, 그 아래 평상 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입장료도 문턱도 없는 속편한 공간
그런 공간은 소중하다.
탑골 공원에서 바둑과 장기를 두던 노인들이 쫓겨났다고 들었다.
“ 탑골공원은 3·1 독립정신이 깃든 국가유산 사적 ” 이라며 바둑 장기 음주 등을 금지한다는 공문이 내붙었다고 한다.
바둑을 두는 자리 주위로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이 행해진다는 비난 역시 따라붙었는데
이 이슈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보았다.
작년 스페이스앤트에서 전시를 하며 수차례 그 앞을 오가던 날들이 기억난다.
공원을 둘러싼 돌담 옆에 공사장 나무 팔레트를 가져다 두고 대국에 몰입 중인 수십명의 노인들의 모습을 보며 장관이라고 생각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활기가 감돌았고 종로라는 역사적 공간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졌다.
며칠 전 낙원상가에 들를 일이 있어 그 앞을 지나쳤다.
우중충한 색의 옷을 입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서서 서성이고 있었다.
나무 팔레트를 잃고 멍하니 서 있는 그들은 마치 도시의 비둘기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갑자기 방향감각을 잃어 서 있는 노인장 한 분에게 탑골공원 입구가 어느 쪽이죠? 하고 물었다.
그는 아니 그걸 몰라 바로 여기야, 저기로도 갈 수 있고, 몇 걸음 걷기까지 하며 열정적으로 길을 알려 주었다.
그의 몸짓에선 반가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자 놀라운 표정으로 웃었다.
이 사이가 모두 벌어져 있었고 점심으로 자신 반찬이 거기에 조금 끼어있었지만 그런 사소한 결점들을 압도하는 진짜 표정이었다.
그들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강인함과 끈질김, 우리 세대로써는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어떤 과격함과 거리없음 역시
전후의 가난, 고속 성장의 대격변 속을 살아남으며 자연스레 길러진 속성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있을 자리를 마련했겠지만 운이 좀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탑골공원에는 노인이, 바둑판이, 박카스 할머니가, 그리고 문턱없음의 미학과 사라져가는 야성이 있었다.
나에게 그것은 그리운 풍경으로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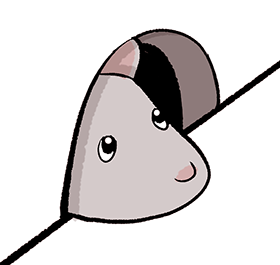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