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문래동 예술공장에서 조각모음이란 전시를 봤다. 홍자영 작가가 참여 중인
현무암이라고 생각했던 물체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3D프린팅 출력물이길래 깜놀
긴 상에 만져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따로 두었는데 그 중에 홍자영 작가 얼굴을 3d프린터로 떠놓은게 있길래 그것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람이 평생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죽는게 꽤나 얼탱이 없고 상징적이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거울로 보는건 평면화된 상일 뿐이니까) 3d프린터가 그걸 꽤 근접하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느낌
예전에 디자이너 분이랑 뭔 얘기를 하다
딱히 팔아먹을 컨텐츠가 없어보이는 사람들마저도 sns 과몰입 하는게 이상하지 않냐 라고 하니 그 분이
자기는 사실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라는 대답을 하셨다.
역사상 이렇게까지 많은 인간들이 자신에게 몰두한 시기가 있었나 싶다.
중세의 귀족들이 화가를 불러 초상을 제작한 것처럼 이제 셀카를 찍으면 AI가 각 버전별로 beautify한 초상을 뚝딱 만들어준다.
하지만 그런 사진을 수백장 확인해도 스스로를 보는 일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을 만들어 내면 낼수록 본질과는 멀어지게 되니까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이 늦길래 옆을 보니 상대가 건물 외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흘끗거리고 있었던 적이 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전화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때 생각이 난다.
만원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느낀 해방감도 기억난다. 빽빽한 인간 숲에서 잠시 벗어나 나만의 공간이 펼쳐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때 화면에 고개를 처박고 있던 사람들이 주위와 자신을 차단하려 시도 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에게 몰두> 라고 말했지만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신의 상에 몰두> 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것을 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진다.
SNS속 타인은 존재가 아닌 나를 대상화하고 평가하는 또다른 대상물이다.
자신의 상에 몰두하기 때문에 자신을 잃게되고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타인을 NPC 취급하게 되는 아이러니
—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다.(L‘enfer, c’est les autres.)”라고 처음 말한 사르트르는 이 말이 “늘 오해되어 왔다”고 했다. “타인과의 관계는 언제나 해가 되고 지옥처럼 된다는 뜻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한 건 좀 다르다”고 했다. 이 연극에 대한 1965년 강연에서 그가 한 말이다.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중략)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인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263605#home
“여기에 지하 동굴이 있다. 동굴 속에는 죄수가 갇혀 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두 팔과 두 다리가 묶인 채로 동굴 벽만 보고 산다…. 죄수의 등 뒤 위쪽에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는 횃불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만을 보고 산다.”
- 플라톤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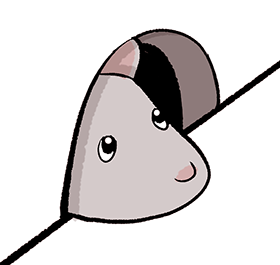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